풍요의 역설과 시지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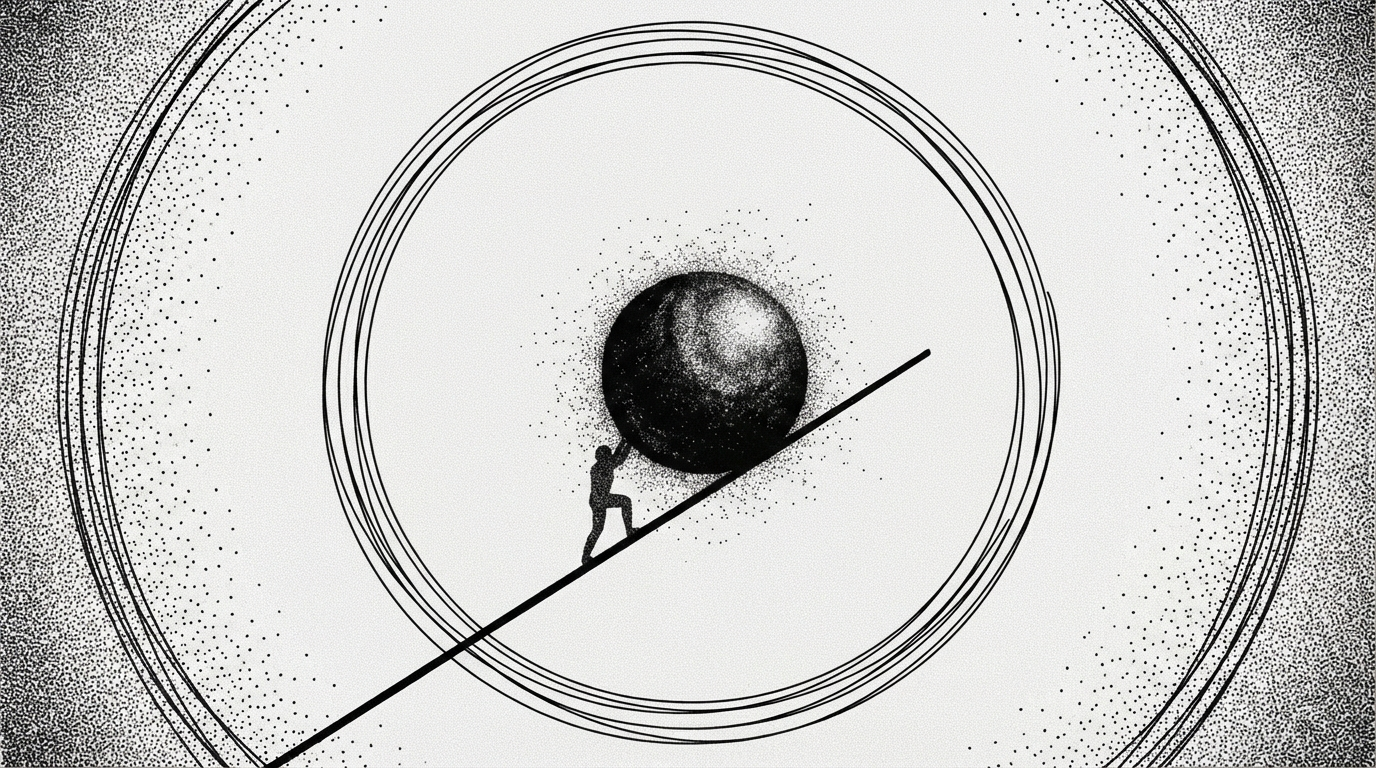
요즘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생산성이 이만큼이나 올랐다면,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경제학자 케인스의 예언처럼 주 15시간만 일해도 충분할 만큼, 물리적인 풍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백 년 전만 해도 생존 그 자체가 과업이었지만, 이제는 기계와 알고리즘, 그리고 AI가 인간 수백 명의 몫을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현실은 많은 이들이 워커홀릭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현상을 마주할 때면 데니스 뇌르마르크가 말한 "가짜 노동"을 떠올리곤 합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질적인 생산은 AI와 상위 1%에게 맡겨두고, 남은 이들은 기본소득으로 누리고 살며 그저 바쁜 척 시간을 메우는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닐까 생각하고는 합니다.
이런 피로 속에서 우리의 휴식과 재충전마저도 양극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이 발전하며 즉각적인 도파민을 주는 낮은 단계의 쾌락들은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쾌락에 닿을 수 있는 세상이니 모두가 행복해진 걸까요? 그런 논의들을 볼 때면 저 역시 늘 확신 없는 반반의 마음이 듭니다. 깊은 사유나 밀도 높은 몰입 같은 높은 쾌락은 이제 아주 희귀하고 비싼 사치재가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저도 남들과 같이 스크롤의 지옥에 빠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는 후회합니다. 이런 굴레 속에 갇혀 있다 보면 정작 무엇을 위해 이 무거운 바위를 밀고 있는지 종종 잊어버리곤 하니까요.
어쩌면 이미 바다를 찾은 물고기의 복에 겨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삶의 모든 것을 지표로 환산하고 증명해야 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휩싸여 있다 보면, 문득문득 현타라고 불리는 감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 또 다른 지표를 계속해서 꺼내 놓아야만 하는 세상. 하는 일들이 충분히 재미있고 주변의 많은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쑥불쑥 허무함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저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풍요의 역설 속에서도 저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두 가지 생각을 삶의 두루뭉술한 이정표로 세워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다시 감각하는 주체가 되어보는 것입니다. 효율과 지표라는 이름 아래 무뎌졌던 사소한 것들을 깨워보려 합니다. 계절이 바뀌며 변하는 공기의 냄새를 맡고,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스마트폰 없이 대화를 나누고,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죠. 흔해진 낮은 쾌락의 회로를 잠시 끊고, 내 실존을 증명하는 아주 작고 사적인 감각들을 복원해보는 일. 저는 이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저항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성취를 넘어선 보편적인 가치에 나를 연결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 성공은 중요합니다. 냉정하게 말해 더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고 지표를 관리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에는 더 효율적인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로지 나만의 성공과 인정에만 매몰될 때, 우리 삶의 바위는 결국 허무라는 심연으로 굴러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생애에 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나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치나 타인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일에 슬쩍 마음을 얹어둡니다.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지표의 세상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허무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여지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 아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을 향해 바위를 밀어 올리지만, 닿는 순간 바위는 어김없이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이 영원히 반복되는 형벌 같은 삶의 궤적 위에서 알베르 카뮈는 하나의 결론에 다다릅니다. 바위가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다시 산 아래로 걸어 내려오는 그 찰나, 시지프스는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 허무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바위에 손을 얹으러 내려가는 순간, 그는 바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됩니다.
카뮈는 이 에세이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La lutte elle-même vers les sommets suffit à remplir une cœur d'homme. Il faut imaginer Sisyphe heureux." (정상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지프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위가 멈춰 서는 정상이 아니라, 바위를 다시 밀어 올리러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의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오르막의 고단함 속에서 찰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를 넘어선 무언가를 꿈꿀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끝없는 반복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 또한 지금, 저의 바위 곁에서 제가 행복하다고 한번 상상하는 노력을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